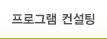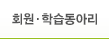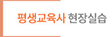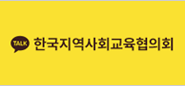글 수 293
조회 수 : 4112
2015.12.04 (10:13:56)
2001년은 정주영 생애의 마지막 해가 되고 만다. 그해 봄빛이 물들어오는 3월 초, 정주영은 청운동 자택에서 위경련으로 누워 있다가 잠시 뜨락으로 내려와 일흔셋 나이의 집사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봐, 자넨 나이도 어린데 왜 그렇게 머리가 하얀가?”
집사는 정주영의 짓궂은 농담에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저렇게 하얀데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정주영은 온 얼굴을 활짝 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웃었다. 그 며칠 뒤 정주영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 급히 아산중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침내 2001년 3월 22일, 정주영은 여든여섯 살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생을 접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다.
‘세상에 올 때 내 마음대로 온 것은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뒤돌아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 잘해 봐야지’.
그가 생전에 즐겨 불렀다는 대중가요 ‘보통 인생’이다. 참으로 보통 인생의 노랫말과 같이 가슴에 꿈도 하도 많아 뒤돌아볼 새도 없이 뛰었던 그의 한평생이었다.
“이봐, 자넨 나이도 어린데 왜 그렇게 머리가 하얀가?”
집사는 정주영의 짓궂은 농담에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저렇게 하얀데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정주영은 온 얼굴을 활짝 펴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웃었다. 그 며칠 뒤 정주영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 급히 아산중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침내 2001년 3월 22일, 정주영은 여든여섯 살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생을 접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다.
‘세상에 올 때 내 마음대로 온 것은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뒤돌아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 잘해 봐야지’.
그가 생전에 즐겨 불렀다는 대중가요 ‘보통 인생’이다. 참으로 보통 인생의 노랫말과 같이 가슴에 꿈도 하도 많아 뒤돌아볼 새도 없이 뛰었던 그의 한평생이었다.

- 아산 정주영. /조선일보 DB
정주영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운동을 펼쳐나갔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운동은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이 시작한 것으로, 초·중등학교 운동장 등 시설을 이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생교육 방법을 찾아보는 사회교육운동이었다. 정주영은 1969년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했다. 서울대 박동규 교수 등 교육계 인사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하면서 사회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정주영은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일하고 있던 최불암에게 ‘좋은 일 좀 같이 해보자’며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참여를 권했다.
1985년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이 들어섰다. 정장현 사장은 최불암과 동창이었는데 그가 최불암에게, 백화점 안에 자리를 내줄 테니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극단을 운영해 보라고 권했다. 이듬해인 1986년 12월 최불암은 150석 규모의 ‘현대예술극장’을 열었다. 개막 첫 작품 ‘애니’에는 정주영 내외가 관람을 왔다. 공연 뒤 330㎡(100평) 규모의 연습장을 빌려 개장 고사를 지내는데 정주영이 참석하여 “가난하긴 하지만 예술은 원래 이렇게 출발하는 거요”라며 격려해 주었다. 정주영은 평소 예술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정주영은 평소 “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며, 아버지로 인해 땀과 부지런함 그리고 가난을 알았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가난이 싫어 집을 뛰쳐나왔다가 서울에서 아버지에게 붙들렸을 때 아버지는 정주영에게 창경원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어린 아들 정주영만 들여보내고 자신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최불암이 말했다.
“현대 마크가 삼각형인데 회장님께서 통천~서산~울산을 잇는 삼각형을 표현하신 것이지요? 파란색은 들판, 노란색은 벼가 익은 모습이고요.”
정주영은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 상상력이 참 대단하구먼.”
정주영은 이북 출신 실향민이었고, 젊은 시절 온갖 고된 노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그런 시절에 알고 지낸 옛 지인들과의 만남을 좋아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 인사들, 문화·예술계를 망라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다. 그중에는 이북 고향에서 내려온 옛 친구들도 있었고, 재벌 총수가 된 그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찾아오는 지인도 있었다. 문화사업이나 사회사업을 한다며 후원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누가 되었든 어떤 경우든 간에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비서진은 진땀을 빼야 했다. 분명히 촌지를 주라고 할 텐데, 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할지 가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보게, 세 개만 가져 와.”
정주영은 손님과의 대화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었다. 세 개라는 것이 3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비서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더구나 쓸데없는 일에 돈 쓰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정주영이었다. 어쨌든 야단을 맞더라도 안전하게 적은 금액부터 올라가는 요령을 썼다. 정주영은 자신이 생각한 액수가 아니면 바로 다시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몇 번 어긋난 뒤 마지막으로 준비하게 되는 액수가 때에 따라서는 억대로 올라가기도 했다. 그렇게 정주영은 ‘씀씀이’가 큰 부자였고 한편으론 검소하기 이를 데 없는 냉철한 ‘구두쇠’였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http://kace.or.kr/99477
(*.133.100.19)